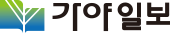난 어릴 때 우리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늘 그리운 엄마였고 우리 사남매가 아플 때 머리맡에 앉아서 “뭐 먹고 싶냐”고 끊임없이 물으시며 끓여주던 녹두죽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아프지 않을 때도 그랬으면 싶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집어던지며 젤 먼저 동생들에게 묻는 말 "엄마는?"
굳이 엄마랑 할 일이 있는 건 아닌데도 엄마는 집안 어딘가 계시면 마음이 안정이 됐고 엄마의 부재는 괜한 짜증이 났다. 그때는 엄마가 나의 울타리였다. 어느덧 85세가 된 엄마, 이제는 내가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하는데 정말이지 버겁다.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자 둘의 사남매 중 장녀인 나는 하루 여덟 시간 종일서서 입에서 단내 나는 아르바이트를 다닌다.
주말이 되면 나도 쉬고 싶지만 엄마는 창밖을 끊임없이 내다보며 날 기다린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거의 TV만 보며 사는 엄마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사회 전반에 대한 소식들을 환히 꿰뚫고 주관 없는 말을 늘어놓으신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알려주는 상식은 안 믿는다. TV에 나오는 박사들이나 패널들이 하는 말이라야 귀에 담는다.
엄마의 팔다리는 물기 빠져 앙상하지만 계산능력과 기억은 나보다 총명하시다. 난 60대임에도 내 아이들의 육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엄마는 사남매의 젖먹이 때를 다 기억하신다.
세상은 급변하고 엄마시대에는 오래 사셨다고 환갑이니 진갑이니 잔치를 했지만 지금은 칠순도 예사인 세상이 됐다. 하물며 경제활동까지 감수해야만 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는 고단하게 시간을 쪼개가며 사는 자식들에게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지겨워 죽겠다며 답답해하신다.
적어도 우리세대부터는 내 자식들에게 ‘시간을 내달라, 놀아 달라’ 어리광 피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팔순이 넘어도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고 아름답게 지나 갈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찾아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며 생각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