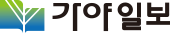기사를 쓸 때 타협하는 일이 종종 있다. 처음 신문사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때보다 내가 갖고 있던 원칙이나 기조가 많이 무너졌다. 아니 무너졌다기보다 발을 한 발 뒤로 뺐다고 해야 맞겠다. 글쓰기에 대한 결벽증이 느슨해진 것이다. 아니면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관행의 얼룩이 묻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익숙해진 것이다. 익숙함이란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소가 다 있는데, 빠르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처음에 이상하고 그릇되게 보이던 관행의 어떤 점들에 대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관행이라잖아”, “뭐, 관행이니까.”
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기사에 대한 엄격성과 순결성도 무뎌지고 두루뭉수리해졌다. 순결성을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장애 요소다. 순결이란 한쪽으로만 열려 있고 다른 쪽으로는 막혀 있다는 뜻도 된다. 일단 기사와 문학적인 글이 다르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또 기사는 매일매일 시류에 따라 흐르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도 익혔다. 이름을 단 기사에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손에 쥐기보다 놓아버려야 한다는 무소유 개념도 이해가게 되었다.
‘본래 내 것인 것은 없다.’
또 한 가지, 기사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만용을 부렸다. 두 번 정도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 특히 현장에 가지 않은 문화예술 공연 내용을 더 풍부하게 돋보이기 위해 팸플릿이나 프로그램으로 기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것처럼 쓰고, 인터뷰의 내용도 구성적으로 그럴 듯하게 꾸며서 내었다. 인터뷰이를 만나지 않고서 따옴표를 쳐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다 싶은 말로 임의적으로 집어넣었다. 분명 거짓인데, 글 쓸 때의 열기에 싸여 꼭 그렇게 해야만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 거라는 의도가 사실보다 더 강하게 작동했다. 더 흥미 있는 기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설정은 묵인해도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미화하고픈 욕구도 가담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이 생선가시처럼 걸려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위안했는데, 갈수록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혹시 이 글을 볼지 모를 그분들께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한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썼으니,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몹시 당황스럽고 불쾌했으며, 신문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은 저렇게 기사를 쓰는구나, 천연덕스럽기도 해라!”
부끄럽지만 고백을 감행한 이유는 잘 못 익힌 습관이 하나의 ‘관행’으로 내 안에서 굳어지기 전에 둥둥 떠 있는 파라핀 같은 지방막을 제거하고 싶어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글에 대해, 대상이든 소재든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싶다. 깐깐하게 굴고 싶다. 기사는 허구가 아니다. 소설적 욕망이 앞선다면 과감히 그 기사거리와 결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