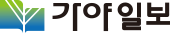시대를 뛰어넘어 오래 남는 만남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여전히 그 빛이 퇴색하지 않는 사랑이 있지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해지거나 먹먹해지거나 울컥해지는, 그런 만남과 사랑이 있습니다.
백석과 김영한의 만남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 백석은 천재적인 재능과 훤칠한 외모로 당시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백석이 함흥 영생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1936년, 회식 자리에 나갔다가 기생 김영한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별은 없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자야’(子夜)라는 애칭을 지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었지만 시대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직장인 여고 영어 선생을 아들로 둔 백석의 부모는 기생과 동거하는 아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억지로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켜 둘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백석은 마지못해 장가를 갔다가 다시 자야에게 도망을 오고, 그런 백석을 보고 자야는 잠적을 하고, 그런 자야를 백석은 찾아오고, 그런 시간이 이어진 끝에 백석은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야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선택으로 백석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자야는 만주로 따라가지 않았고, 그것이 두 사람의 영영 이별이 됩니다.
‘눈은 푹푹 내리고 / 아름다운 나타샤는 / 나를 사랑하고 / 어데서 흰 당나귀도 / 오늘밤이 좋아서 /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로 끝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백석이 자야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두 사람은 6.25가 터지면서 각각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백석은 북에서 1996년 사망하게 되고, 남쪽에 혼자 남겨진 자야는 대한민국의 대표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세워 엄청난 재력가가 됩니다.
대원각은 나중에 길상사가 되는데,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김영한이 아무 조건 없이 시주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왔기에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10여 년 세월 끝에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하니 그 또한 귀하게 여겨집니다. 시주 당시 대원각의 시가가 1,000억 원을 넘었다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벼운 결정이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야는 1999년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상당한 재산을 기부했는데, 아깝지 않았느냐고 말이지요. 세상의 관심은 늘 그런 것이니까요. 그때 자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0억 재산이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김영한이 품고 있었던 백석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내 모든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 내게는 그것이 무엇일지요?
한희철 목사